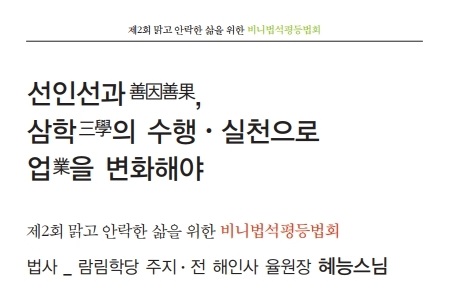비니법석 | 선인선과, 삼학의 수행·실천으로 업을 변화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맑은소리맑은나라 작성일19-04-02 16:11 조회3,235회 댓글0건본문
오늘은 부처님의 초기 경전 가운데 계율에 관련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은 니까야 경전 중 가나까 목갈라나 경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바라문 가나까 목갈라나가 부처님께 질문하시기를, “고따마 존자시여, 미가라마뚜 강당같은 건물을 지으려면 점진적인 배움과 실천, 발전의 단계가 있습니다. 강당이 그러하듯이 활을 쏘는 이도 처음부터 잘 쏘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배우고 실천하여 발전합니다. 저 같은 회계사도 그러한데,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에도 점진적인 배움과 실천, 발전의 단계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떨까요? 부처님이 꽃을 한 송이 들어 보였을 때 그를 지켜보던 대중들은 의미를 알지 못하여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마하가섭 존자만이 부처님의 의도를 알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를 염화미소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질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부처님은 가르침을 점진적으로 실천하고 수행하여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활 쏘는 이나 회계사처럼 공부하는데 있어 단계적으로 배우고 실천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 계율도 단계가 있다고 바라문에게 답하셨습니다.
수행이라는 말을 ‘바바나’라 합니다. 이는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어두운 생각을 밝게 바꾸고, 거칠고 산만한 내 마음을 섬세하고 고요하게 변화시키고 바꿔 가는 작업을 수행, 바바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수행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불과 독경, 참선 등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데, 이러한 수행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고 산만한 마음을 고요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나의 업장을 소멸해주시고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시며 바라는 원을 성취해주시길 바란다면, 수행이 아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기도할 대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길·흉·화·복과 같은 일이 왜 생겨날까요?
하느님과 같은 신이 있어 모든 일은 신이 창조하고 신의 주제 하에 발생한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주에 의해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다 정해졌다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 두 가지 다 믿지 않으며 모든 일은 어떠한 원인과 조건도 없이 우연히 발생한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서는 이 세 가지 생각을 삼종외도三種外道 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 생겨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에 의해, 사주에 의해 혹은 우연히 모든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현재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일은 내 의지로 일어나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스스로 원인이나 업을 지었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선업을 지으면 행복해지고 악업을 지으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도 하는 것이 아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나는 인도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행한다고 하면서 부처님께 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처님은 빌어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결정된 일도, 우연히 발생되는 일도 없으며 내가 원인을 지으면 그것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뉜다고 깨달으신 것입니다. 수행을 ‘도를 닦는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만 그 의미가 변화시키고 바꾼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업을 짓고 그로 인해 행복과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내 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행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니 삼학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계율을 배워야 합니다. 계율이라 하면 부담을 갖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듣지 않고 외면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나의 행위에서 일어난 업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행과 고통을 초래하는 살생과 거짓말 등의 일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이 들며 계율에 대한 부담이 사라집니다. ‘사소한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지켜야 할 학습계율을 수용하고 배워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들은 사소한 잘못을 보고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불자가 아닌 분들은 잘못을 보아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삼종외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에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업자득自業自得, 본인이 지은 업을 돌려받게 된다면, 작은 허물이라도 그에 의한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이라도 그 행동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면 선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허물을 보면서도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참회를 해야 합니다. 즉 수행, 바바나란 우리 자신의 업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작업입니다. 어두운 업을 밝게, 부정한 업을 맑고 청정하게, 산만한 업을 고요하게 바꾸는 작업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를 티벳말로 ‘곰’이라고 하는데, 이는 익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가르침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익숙해지기 위해 선업을 짓고 보리심에 익숙해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부처님은 가나까 목갈라마에게 “법과 계율에도 점진적인 배움이 있고 실천이 있으며 발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배우는 방법에 대해 바라문에게 일러주시길 “모름지기 계행을 닦고 계율을 갖추어라. 계율의 항목을 수호하고 지켜서 행동규범을 완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수행의 전부가 아닌 첫걸음입니다. 점진적 배움을 위해 첫 번째, 계행과 계율을 두루 갖추게 되면 두 번째 수행으로 나아갑니다. “수행승이여, 그대는 감각능력感覺能力 의 활동을 수호하라” 계를 지킨 다음 감각능력의 문을 수호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보고 듣는 데로 끌려가면 온전히 계를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를 지키고 수행한다면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보라 수행승이여, 식사하는데 분량을 알아라” 세 번째로 음식을 먹을 때 양을 알라고 했습니다. 평소 본인이 먹는 음식의 양을 알고 폭음 혹은 폭식을 해선 안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닌, 몸을 지탱하고 청정한 수행을 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수행승이여, 깨어있음에 전념하라” 네 번째는 낮에는 경행과 좌선으로 모든 장애에서 마음을 청정히 하라,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수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려라”, “한적한 숲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계곡이나 동굴이나 묘지나 숲이나 짚더미가 있는 외딴곳 처소에서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계율을 지키고 감각을 수호하며, 음식의 양을 알고 깨어 있음에 전념하며 책임을 확인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는 단계까지 수행을 마친 사람이 비로소 다음 단계인 고요한 장소에서 혼자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장애가 생겼을 때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수행을 말합니다. “탁발托鉢 에서 돌아와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게 펴 얼굴을 앞으로 하고 앉아라. 마음챙김을 확립하고 앉아 수행의 다섯 가지 장애를 끊어라” 수행에 장애가 되는 다섯 가지 오장五障 을 끊고서 수행하게 되면 비로소 첫 번째 선정禪定, 초선에 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수행하여 두 번째 선정, 세 번째 선정을 수행하고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네 번째 선정을 얻기 위해 먼저 계를 지키고 감각 능력을 수호하는 등의 단계를 거치며 수행했을 때, 깊은 단계의 선정을 얻게 되고 거기서 지혜가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로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삼학입니다. 수행의 내용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삼종외도를 부정하신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를 지키고 선정에서 마음을 닦아야 하며 삼학에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삼학을 배움으로 나의 행위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수행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풀이에 익숙해지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