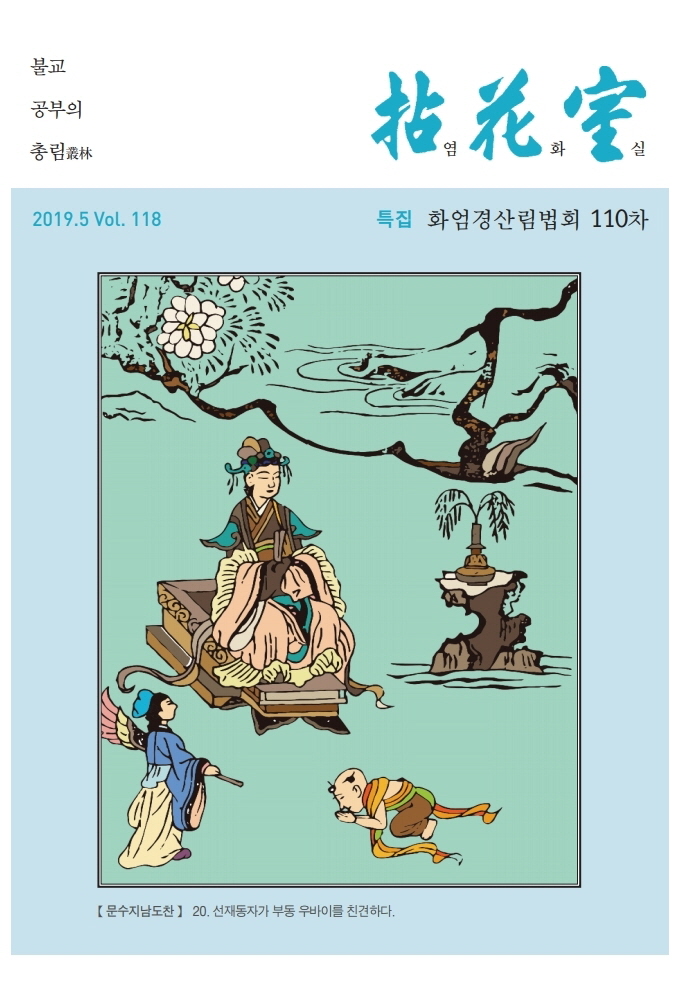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三十四 第六會 一品 十地分 十地品 第二十六之一 正宗分 3/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맑은소리맑은나라 작성일19-05-10 10:30 조회1,868회 댓글0건본문
(12) 發願後의 十心
佛子야 菩薩이 發如是大願已에 則得利益心과 柔軟心과 隨順心과 寂靜心과 調伏心과 寂滅心과 謙下心과 潤澤心과 不動心과 不濁心하니라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은 큰 서원을 발하고는 곧 이익하게 하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따 라 순종하는 마음과 고요한 마음과 조복하는 마음과
적멸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윤택한 마음 과 움직이지 않는 마음과 혼탁하지 않은 마음을 얻느니라.”
·발원후 發願後 의 십심 十心 : 서원을 발한 후 얻는 열 가지 마음
초지보살이 열 가지 원을 다 발하였는데 그 원을 발한 뒤의 열 가지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불자 佛子 야 : 불자야 ·보살 菩薩 이 : 보살이
·발여시대원이 發如是大願已 에 : 이와 같은 큰 원을 발하고 나서
·즉득이익심 則得利益心 과 : 이익된 마음도 얻고
·유연심 柔軟心 과 : 유연한 마음도 얻고
·수순심 隨順心 과 : 누구에게든지 수순하는 마음도 얻는다. 보현행원품에도 수순중생이 있다. 수 순은 참 중요한 것이다.
중생을 수순해주기가 얼마나 힘든가. 중생은 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데 그것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찌 절대적으로 옳은가?
· 앞에서 내가 잠자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도송을 지었다고 말했는데 ‘옳다 다 옳다, 맞다 다 맞다, 좋다 다 좋다’ 이렇게 해버리면 만사형통이다.
· 그러면 수순해 줄 수 있다. 나만 옳은 게 아니고 너도 옳으니까 수순하는 것이다. ‘네 시끄러 운게 귀찮아서 내가 수순해 준다’ 가 아니다. ‘네 말도 옳기 때문에 내가 수순해 준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적정심 寂靜心 과 : 적정심 ·조복심 調伏心 과 : 조복심 ·적멸심 寂滅心 과 : 적멸심
·겸하심 謙下心 과 : 겸하심, 참 좋은 말이다.
·윤택심 潤澤心 과 : 윤택심, 억지로 겸하하는 것이 아니라 겸하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사람이 윤 택해진다. 맨 처음에 출가해서 행자실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
절에 들어가면 행자실에서 맨 먼저 보는 글이 하심 下心 이다. ‘저게 무슨 뜻인가? 아래 하 下 자 마음 심 心 자는 알겠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인가’ 아무리 들어도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야 하심이라는 말이 겨우 이해가 된다. 겸하심이 되면 그때사 사람이 윤택해 지는 것이다.
·부동심 不動心 과 : 부동심 어떤 경우에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마음
·불탁심 不濁心 하니라 : 불탁심, 혼탁하지 않은 마음 이것이 열 가지 마음이다. 원을 발한 후에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마음이 준비되고 바탕이 된 뒤에 그런 원이 제대로 생명력을 발 하는 것이다.
10, 信成就者
成淨信者는 有信功用하야 能信如來本行所入하며 信成就諸波羅蜜하며 信入諸勝地하며 信成就 力하며 信具足無所畏하며
信生長不可壞不共佛法하며 信不思議佛法하며 信出生無中邊佛境界하 며 信隨入如來無量境界하며 信成就果하나니 擧要言之컨댄 信一切菩薩行과 乃至如來智地說力故 니라
“청정한 신심을 성취한 이는 신심의 공용 功用 이 있어 여래께서 본래 행 行 으로 들어가신 것을 믿 으며, 모든 바라밀다를 성취함을 믿으며,
모든 수승한 지위에 들어감을 믿으며, 힘을 성취함을 믿 으며, 두려움 없음을 구족함을 믿느니라.
또 깨뜨릴 수 없는 함께 하지 않는 불법의 생장함을 믿으며, 부사의한 불법을 믿으며, 중간도 가장자리 [中邊] 도 없는 부처님 경계를 내는 것을 믿으며,
여래의 한량없는 경계에 따라 들어감 을 믿으며, 과보를 성취함을 믿느니라.
중요한 점을 들어 말하자면 일체 보살의 행과 내지 여래의 지혜의 지위와 말하는 힘을 믿는 것이니라.”
·신성취자 信成就者 : 믿음을 성취한 보살이 믿는 것 발원후의 십신이라. 열 가지 믿음이다.
·성정신자 成淨信者 는 : 청정한 믿음을 이룬 사람은
·유신공용 有信功用 하야 : 믿음의 공용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작용을 발휘한다는 말이다.
·능신여래본행소입 能信如來本行所入 하며 : 능히 여래가 본래 행하던, 여래가 본래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하던 그 행 그것에 들어가는 바를 믿으며
·신성취제바라밀 信成就諸波羅蜜 하며 : 모든 바라밀을 성취함을 믿으며
·신입제승지 信入諸勝地 하며 : 또 모든 수승한 지위에 들어감을 믿으며
·신성취력 信成就力 하며 : 신성취함을 믿으며
·신구족무소외 信具足無所畏 하며 : 무소외 구족함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울 바가 없음을 믿으며
·신생장불가괴불공불법 信生長不可壞不共佛法 하며 : 무너뜨릴 수 없는 불공불법 특별한 부처님의 법,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불법 생장함을 믿으며
·신부사의불법 信不思議佛法 하며 : 부사의 불법을 믿으며
·신출생무중변불경계 信出生無中邊佛境界 하며 : 무중변 중변이 없다. 중간도 치우치는 변두리도 없 는 불경계에 출생함을 믿는다. 부처님의 경계는 중도의 어떤 삶이라고 표현을 한다.
중간하고 는 다르다. ‘중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변 邊 은 말할 것도 없이 치우친 생각이다. 부처님경계 인 중도의 중 中 은 중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신수입여래무량경계 信隨入如來無量境界 하며 : 여래의 한량없는 경계에 따라 들어감을 믿으며
·신성취과 信成就果 하나니 : 과 果 성취함을 믿으며 틀림없이 뒤에 과가 나온다. 제1지 환희지에 들어가서 환희지 수행이 원만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다는 말이다.
·거요언지 擧要言之 컨댄 : 요점을 들어서 말하는데
·신일체보살행 信一切菩薩行 과 : 일체 보살행과
·내지여래지지설력고 乃至如來智地說力故 니라 : 내지 여래 지혜의 지위와 설법하는 힘을 믿느니라.
11, 住地菩薩의 念慮
佛子야 此菩薩이 復作是念호대 諸佛正法이 如是甚深하며 如是寂靜하며 如是寂滅하며 如是空하며 如是無相하며 如是無願하며
如是無染하며 如是無量하며 如是廣大어늘 而諸凡夫가 心墮邪 見하야 無明覆 翳 하며 立 憍 慢高幢하며 入渴愛網中하며 行諂 誑 稠林하야
不能自出하며 心與 慳 嫉 로 相應不捨하야 恒造諸趣受生因緣하며 貪 恚 愚癡로 積集諸業하야 日夜增長하며 以忿恨風으로 吹心識火하야 熾然不息하며
凡所作業이 皆顚倒相應하며 欲流와 有流와 無明流와 見流가 相續起 心意識種子하야 於三界田中에 復生苦芽하나니 所謂名色이 共生不離하며 此名色이 增長하야
生 六處聚落하며 於中에 相對生觸하며 觸故로 生受하며 因受生愛하며 愛增長故로 生取하며 取增長 故로 生有하며 有生故로 有生老死憂悲苦惱하야 如是衆生이 生長苦趣하나니
是中皆空하야 離我 我所라 無知無覺하며 無作無受호미 如草木石壁하며 亦如影像이어늘 然諸衆生이 不覺不知하나 니 菩薩이 見諸衆生이 於如是苦聚에 不得出離라
是故로 卽生大悲智慧하며 復作是念호대 此諸衆 生을 我應救拔하야 置於究竟安樂之處라 是故로 卽生大慈光明智니라
“불자여, 이 보살이 또 이런 생각을 하느니라.‘ 부처님의 바른 법이 이와 같이 깊고, 이와 같이 고요하고, 이와 같이 적멸하고, 이와 같이 공 空 하고, 이와 같이 모양이 없고,
이와 같이 원 願 이 없 고, 이와 같이 물들지 않고,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이와 같이 광대하건만 모든 범부들이 삿된 소 견에 빠져 무명에 가려져서 교만의 깃대가 높이 섰으며,
애착의 그물에 얽매여 아첨과 거짓의 빽 빽한 숲 속을 다니면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며, 마음은 인색과 질투가 서로 맞아서 버리지 못하 고, 여러 갈래에 태어날 인연을 항상 짓느니라.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으로 모든 업을 지어서 밤낮으로 증장하고, 분노의 바람으로 마 음과 의식의 불을 일으켜서 치성한 불꽃이 쉬지 않으며, 모든 짓는 업이 다 뒤바뀜과 상응하게 되 느니라.
욕망의 폭류 [欲流] 와 있음에 대한 폭류 [有流] 와 무명의 폭류 [無明流] 와 소견의 폭류 [見流] 가 서로 계속하여 마음과 뜻과 의식 [心意識] 의 종자를 일으키느니라.
삼계 三界 라는 밭에서 다시 고통의 싹을 내느니라. 이른바 정신 [이름] 과 물질 [名色] 이 함께 나서 떠나지 아니하며, 정신과 물질이 증장하여 여섯 군데의 기관 [聚洛] 을 내고,
그 속에서 서로 대하 여 접촉함 [觸] 을 내며, 접촉함으로 받아들임 [受] 을 내고, 받아들임으로 사랑함을 내고, 사랑이 자 라서 취 (取) 함을 내고, 취함이 증장하여 소유 [有] 를 내느니라.
소유가 생김으로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과 번거로움을 내느니라. 이와같이 중생이 고통의 갈래 속에서 생장하느니라.
이러한 것들 가운데는 모두 공하여 ‘ 나’ 와 ‘ 나의 것’ 을 떠났으므로 알음알이가 없고, 깨달음도 없으며, 짓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음이 마치 초목이나 돌과 같으며 또한 영상과도 같으니라.
‘ 중생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하느니라.
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고, 큰 자비와 지혜를 내어 다 시 또 생각하기를 ‘ 이 모든 중생들을 내가 응당히 건져 내어 구경까지 안락한 곳에 둘 것이니,
그 러므로 큰 자비와 광명의 지혜를 내리라.’ 라고 하느니라.”
·주지보살 住地菩薩 의 염려 念慮 : 환희지에 머문 보살의 염려
제1지에 머문 보살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12인연 같은 이야기는 없었다. 그런데 말씀드 렸듯이 십지품은 하나의 품으로써 완전한 독립된 경전이다.
그래서 독립된 경전이라고 생각을 하 고 편찬을 한다면 그 안에 소승교리든 대승교리든 모든 불교 교리가 다 담겨야 된다. 담기되 그대 로 수순하는 것이 아니라
화엄경의 안목에서 12인연도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하되 소승교리와는 다른 안목으로 해석을 한다.
·불자 佛子 야 : 불자야
·차보살 此菩薩 이 : 이 보살이
·부작시념 復作是念 호대 : 다시 이러한 생각을 하되
·제불정법 諸佛正法 이 : 모든 부처님의 정법이
·여시심심 如是甚深 하며 : 이와 같이 심심하며
·여시적정 如是寂靜 하며 : 이와 같이 적정하며
·여시적멸 如是寂滅 하며 : 이와 같이 적멸하며
여시공 如是空 하며 : 이와 공하며
·여시무상 如是無相 하며 : 이와 같이 무상하며
·여시무원 如是無願 하며 : 이와 같이 무원하며, 원이 없으며 이런 것, 무상 무원, 공 적멸 적정이건 전부 기본교리 소승교리의 용어들이다.
·여시무염 如是無染 하며 : 이와 같이 무염하며 물듦이 없으며 ·여시무량 如是無量 하며 : 이와 같이 한량이 없으며
·여시광대 如是廣大 어늘 : 이와 같이 광대하거늘, 화엄경 식으로 표현하다보니까 이렇게 열 가지로 또 이야기한다.
·이제범부 而諸凡夫 가 : 그러나 모든 범부가
·심타사견 心墮邪見 하야 : 마음이 삿된 소견에 떨어져서, 모든 불법은 여시 심심하고 적정하고 적 멸하고 공하고
무상하고 무원하고 무염하고 무량하고 광대한데 그러나 모든 범부들은 그와 반대로 삿된 소견에 떨어져서
·무명부예 無明覆 翳 하며 : 캄캄한 무명 지혜 없음으로 뒤덮여 있고
·입교만고당 立 憍 慢高幢 하며 : 교만의 높은 깃대를 세운다. 교만이 제일 문제다. 교만의 높은 깃발을 세우고
·입갈애망중 入渴愛網中 하며 : 갈애망중에 들어간다. 갈애, 아주 목이 타듯이 애착하는 그물 가운데 들어가며
·행첨광조림 行諂 誑 稠林 하야 : 첨광은 거짓이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나의 어떤 허물을 막고 있는 대로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도 남을 대해서 거기에 맞게 자기를 표현 하고자 하는 것이 첨광이다. 사실은 전부 거짓이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빽빽한 숲과 같다.
사 람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빽빽한 숲과 같은 것을 행해서
·불능자출 不能自出 하며 : 능히 스스로 나오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대밭은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가 있다.
그런데 인도의 대밭은 들어갈 수도 없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이 빽빽하다. 그 것이 조림이다. 우리 소견이 그렇다는 것이다. 바늘 끝도 용납을 못한다.
나와 다른 사람의 주 장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소견은 도대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 그저 자기 생각만 옳고, 죽으나 사나 자기 소견만 옳다고 주장한다. 그런 것을 조림이라고 한다. 불능자출하며 거기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며
·심여간질 心與 慳 嫉 로 : 마음이 아끼고 질투하는 것으로 더불어서, 아끼는 것을 좋아하고 남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 허물 감추고 이런 것이 너무 마음에 들고
·상응부사 相應不捨 하야 : 서로 맞아서 버리지 않는다. 어디 가도 그런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한다. 한 번도 자기의 진실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마음의 시기 질투 자기 허물을 감추고 주장하는 번뇌가 있어서 자기의 허물이나 자기의 약점을 감춘다.
늘 뉴스에 나오듯이 정치하는 사람 들이 전부 아니라고 하고 발뺌을 하고 절대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런 것이 상응부사 하야 서로 맞아서 버리지 아니해서
·항조제취수생인연 恒造諸趣受生因緣 하며 : 항상 모든 갈래에 생을 받는 인연을 짓는다. 거짓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사취한다고 하면 그 인연이 어디 가겠 는가? 수순인연이 어디 가겠는가? 뻔한 것이다.
우리 불교가 세상에 제일 급하게 깨우쳐 주고 전해야 할 것이 인과의 도리다. 그래서 내가 자주 이야기한다.
· 인과의 이치를 깨우쳐 주면 그 인과가 무서워서라도 못할 것이 아닌가. 우리 불자들은 전부 인 과가 무서워서 못한다.
어떤 경우는 미운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인과가 겁이 나서 못하는 것 이다.
· 불교가 세상에 할 일은 인과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것이 제일 급한 일이다. 그에 비 하면 명상은 소용없다.
인과의 도리를 깨우쳐 줘서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저 위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인과의 법칙대로 정직하게 모든 것을 수용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울 까닭이 없다.
정직하게 수용하는 것은 스스로 인과를 알고 인과가 두려워서 정직하게 할 수 밖 에 없도록 남을 속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불교가 세상에 무엇을 할 것인가? ’ 내가 생각해보니 물론 보살행이 중요하고 보살행 중에서 도 제일가는 것은 법을 가지고 세상에 펼치는 일이다.
그런데 법이란 무엇인가? 인과의 법이다. 인과법을 제대로 가르쳐서 인과의 법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과법대로 전부 정직 하고 선량하게 살도록 하면 그것이 그대로 극락세계다. 제취에 수생하는 인연을 항상 지으며
·탐에우치 貪 恚 愚癡 로 :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적집제업 積集諸業 하야 : 온갖 업을 쌓아서
·일야증장 日夜增長 하며 : 낮도 밤도 없이 계속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다.
·이분한풍 以忿恨風 으로 : 분과 한의 바람으로써
·취심식화 吹心識火 하야 : 심식의 불길에 막 나부낀다. 선풍기를 돌려대는 것이다. 분한의 바람으로써 심식의 불에 나부껴서
·치연불식 熾然不息 하며 : 활활 타서 쉬지 않으며 ·범소작업 凡所作業 이 : 무릇 업을 짓는 것이
·개전도상응 皆顚倒相應 하며 : 다 전도와 상응해서 뒤바뀐 것, 바르게 하지 않고 전부 뒤바뀌고 꺼꾸러지고 옳게 되지 아니한 것과 상응하며
·욕류 欲流 와 : 욕류와
·유류 有流 와 : 유류와
·무명류 無明流 와 : 무명류와
·견류 見流 가 : 견류가
·상속기심의식종자 相續起心意識種子 하야 : 상속해서 심의식의 종자를 일으킨다. 이것은 사류라고 해서 네 가지 흐름이다.
욕류는 안이비설신의 그것을 가지고 전부 우리가 하고자 하려는 것만 좇아간다.
눈은 빛깔을 보고 귀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코는 좋은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전부 거기에 집착을 하고 분별을 일으킨다. 그것이 욕유, 욕망의 흐름이다.
그 다음 유류는 존재의 흐름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 그것을 우리가 다 흘러다니는 것이다. 무명류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견도 없고 그저 탐욕만 나부끼 는 것이다.
그러한 온갖 번뇌들이 뒤범벅된 것을 무명류라고 한다. 무명은 번뇌의 통칭이고 전체 번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명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견류는 소견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저 죽을 때까지 그걸 고집하는 소견 그런 것이 견류가 된다. 그런 것이 상속해서 심의식 종자를 일으킨다.
그것이 내 삶 을 만든다. 내 인격체를 만들고 내 삶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삼계전중 於三界田中 에 : 삼계의 밭 가운데서
·부생고아 復生苦芽 하나니 : 다시 고통의 싹을 틔우나니
·소위명색 所謂名色 이 : 소위 명색이
·공생불리 共生不離 하며 : 명과 색은 12인연 이야기다. 십이인연의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로 설명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어떤 과정들이 12인연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명과 색이 같이 난다. 명색 중에 명은 정신적인 것 색은 물질적인 것이다. 이것이 공생불리해서 같이 우 리 태 안에서 육근이 낱낱이 제대로 또렷또렷하게 생기기 이전에 두루뭉숭이로 생겨있다.
거 기에서 정신적인 부분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서로 같이 어울려서 떠나지 않는다.
·차명색 此名色 이 : 태중에서 명과 색이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육체적인 부분이 한데 어울리 고 그것이 차츰차츰 시간이 가면서 자란다. 몇 개월 몇 개월 다 명기해 놓은 이론도 있는데 그 것이
·증장 增長 하야 : 증장하야
·생육처취락 生六處聚落 하며 : 생육처취락이다. 이것이 육입이다. 육처 취락을 내며, 육처취락 육 근이 제대로 생긴다는 말이다.
태아가 생장하는 과정을 보면 육근이 또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 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눈도 귀도 코도 분명해진다. 그런 초음파 사진들도 우리가 본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중 於中 에 : 그 가운데서
·상대생촉 相對生觸 하며 : 촉감을 낸다. 서로 대해서 감촉을 낸다. 이것은 태어난 이후라고 본다. 모태에서 태어난 이후에 차고 더운 것을 잘 느낀다.
· 그래서 아기들에게 태내의 온도와 똑같이 만들어 준다고 얼마나 보호를 잘 하는가. · 너무 차도 안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되고 태중의 온도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촉감을 낸다.
·촉고 觸故 로 : 촉고로 촉감이 있는 까닭에
·생수 生受 하며 : 받아들이는 것을 낸다. 만져 보니까 이것은 어머니 살갗이고 만져보니까 이것은 어머니하고 다른 감촉이 있는 살갗이다 라고 그냥 아는 것이다.
·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어린아이도 그냥 안다. 감촉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며
·인수생애 因受生愛 하며 : 받아들이는 것을 인해서 애착을 낸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애착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아기들이 어머니만 찾는 것이 아닌가. 애착을 하 며
·애증장고 愛增長故 로 : 애착이 자꾸 증장하는 까닭에
·생취 生取 하며 : 취를 낸다. 그래서 어머니만 자꾸 찾는 것이다. 그것이 취다.
·취증장고 取增長故 로 : 또 취가 증장하는 까닭에 취가 자꾸 발전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이성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이 한다. 취가 증장하는 까닭으로
·생유 生有 하며 : 생유라. 소유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들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자 기에 맞는 어떤 이성을 좋아한다. 그런 것이 소유를 내는 것이다. ‘내게 맞는 이것을 내가 계 속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소유다.
·유생고 有生故 로 : 소유가 생기는 까닭에
·유생노사우비고뇌 有生老死憂悲苦惱 하야 : 노사우비 고뇌를 내게 된다.
·여시중생 如是衆生 이 : 이와 같이 중생이
·생장고취 生長苦趣 하나니 : 괴로움의 갈래를 생장하나니
·시중개공 是中皆空 하야 : 이 가운데 다 공해서, 오온개공 五蘊皆空 반야심경과 연결이 된다. 이 가운데 오온이 개공해서
·이아아소 離我我所 라 : 아와 아소를 떠난 것이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왔지만 이것이 다 공한 줄을 알아서 아와 아소를 떠났다. 나와 나의 것 거 기에는 어머니도 해당되고 내가 먹던 음식도 해당되고 모든 내 소유가 다 아소에 해당된다.
·무지무각 無知無覺 하며 : 앎도 없고 지각도 없으며
·무작무수 無作無受 호미 : 지음도 없고 받아들임도 없으며 아와 아소를 다 떠났으니까 그런 것을 다 떠난 상태다. 여기는 그런 것이
·여초목석벽 如草木石壁 하며 :초목과 석벽과 같아서
·역여영상 亦如影像 이어늘 : 또한 마치 영상과 같더라. 그림자를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 초지보살은 그 정도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그림자처럼 본다. 여몽환포영 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 如露亦如電 이다.
·연제중생 然諸衆生 이 : 그러나 모든 중생들이
·불각부지 不覺不知 하나니 : 다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나니 ·보살 菩薩 이: 보살이
·견제중생 見諸衆生 이 : 모든 중생이
·어여시고취 於如是苦聚 에 : 이와 같은 고苦의 무더기에
·부득출리 不得出離 라 : 벗어나지를 못한다. ·시고 是故 로 : 시고로
·즉생대비지혜 卽生大悲智慧 하며 : 곧 큰 자비와 지혜를 내며
·부작시념 復作是念 호대 : 다시 이러한 생각을 한다. 여기서부터는 보살이 그렇게 한다는 뜻이다.
·차제중생 此諸衆生 을 : 이 모든 중생을
·아응구발 我應救拔 하야 : 내가 응당히 구제하고 빼내어서
·치어구경안락지처 置於究竟安樂之處 라 : 구경의 가장 안락한 곳에 갖다 두겠다 라고 한다.
·시고 是故 로 : 시고로
·즉생대자광명지 卽生大慈光明智 니라 : 곧 대자 큰 사랑의 광명 지혜를 내느니라.
· 이것이 말하자면 초지에 머문 보살의 생각이다. 초지에 머문 보살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12, 大慈悲心과 布施
佛子야 菩薩摩訶薩이 隨順如是大悲大慈하야 以深重心으로 住初地時에 於一切物에 無所 惜 하고 求佛大智하야 修行大捨할새
凡是所有를 一切能施호대 所謂財穀倉庫와 金銀摩尼와 眞珠瑠 璃와 珂貝璧玉과 珊瑚等物과 珍寶瓔珞嚴身之具와 象馬車乘과 奴婢人民과 城邑聚落과 園林臺觀 과
妻妾男女와 內外眷屬과 及餘所有珍玩之具와 頭目手足과 血肉骨髓와 一切身分을 皆無所惜하 야 爲求諸佛廣大智慧하나니 是名菩薩이 住於初地하야 大捨成就니라
佛子야 菩薩이 以此慈悲大 施心으로 爲欲救護一切衆生하야 轉更推求世出世間諸利益事호대 無疲厭故로 卽得成就無疲厭心 하며 得無疲厭心已에 於一切經論에 心無怯弱하고
無怯弱故로 卽得成就一切經論智하며 獲是智 已에 善能籌量應作不應作하야 於上中下一切衆生에 隨應隨力하고 隨其所習하야 如是而行일새
是故로 菩薩이 得成世智하며 成世智已에 知時知量하야 以 慚 愧莊嚴으로 勤修自利利他之道일새 是故로 成就 慚 愧莊嚴하며 於此行中에 勤修出離하야
不退不轉하야 成堅固力하며 得堅固力已에 勤供諸佛하야 於佛敎法에 能如說行이니라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은 대비 大悲 와 대자 大慈 를 수순하여 깊고 중대한 마음으로 초지 初地 에 머물 때에 모든 물건을 아끼지 않고
부처님의 큰 지혜를 구하며 크게 버리는 일을 수행하 여 가진 것을 모두 보시하느니라.
이른바 재물과 곡식과 창고와 금과 은과 마니와 진주와 유리와 보석과 보패와 산호 등의 보물 과 영락 등 몸을 장식하는 장엄거리와
코끼리와 말과 수레와 노비와 사환과 도시와 마을과 원림 과 누대와 처첩과 아들과 딸과 안팎 권속들과 그 외의 훌륭한 물건들과
머리와 눈과 손과 발과 피 와 살과 뼈와 골수 등 모든 몸의 부분들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보시하여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를 구하느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초지에 머물러서 크게 버리는 일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느 니라.
불자여, 보살이 이 자비로 크게 보시하는 마음으로써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하여 점점 다시 세간과 출세간의 여러 가지 이익하게 하는 일을 구하면서도
고달픈 마음이 없으므로 곧 고달픈 줄 모르는 마음을 성취하느니라.
고달픈 줄 모르는 마음을 얻고 나서는 일체 경 經 과 논 論 에 대하여 마음이 겁약함이 없느니라.
겁약함이 없으므로 곧 일체 경론 經論 의 지혜를 성취하느니라.
이 지혜를 얻고 나서는 응당히 지을 일과 응당히 짓지 아니할 일을 잘 요량하고 상·중·하품 의 일체 중생에 대하여 마땅함을 따르고
그 익힌 바를 따라서 그와 같이 행하나니 그러므로 보살이 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되느니라.
세간의 지혜를 이루고 나서는 시기를 알고 그 양을 알아 부끄러움의 장엄 [ 慚 愧莊嚴] 으로 스스로 이롭고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도를 부지런히 닦느니라.
그러므로 부끄러움의 장엄을 성취하느 니라.
이러한 행에서 벗어나는 일을 부지런히 닦아 퇴전하지 아니하면 견고한 힘을 이루며, 견고한 힘을 얻고 나서는 모든 부처님께 부지런히 공양하고 부처님의 교법에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느니 라.”
·대자비심 大慈悲心 과 보시 布施
·불자 佛子 야 : 불자야
·보살마하살 菩薩摩訶薩 이 : 보살마하살이
·수순여시대비대자 隨順如是大悲大慈 하야 : 이와 같은 대비대자를 수순해서
·이심중심 以深重心 으로 : 깊고 무거운 마음으로써
·주초지시 住初地時 에 : 초지에 머물 때, 환희지에 머물 때
·어일체물 於一切物 에 : 일체 사물에 있어서
·무소인석 無所 悋 惜 하고 : 그 무엇에도 아끼는 바가 없어서
·구불대지 求佛大智 하야 : 부처님의 큰 지혜를 구해서
·수행대사 修行大捨 할새 : 대사를 수행할새 크게 평등하게 보는 것, 대사의 사 捨 자는 평등이다. 평등함을 수행할새
·범시소유 凡是所有 를 : 무릇 있는 바를
·일체능시 一切能施 호대 : 일체를 다 능히 다 보시하되
·소위재곡창고 所謂財穀倉庫 와 : 소위 재물 곡식 창고
·금은마니 金銀摩尼 와 : 금 은 마니
·진주유리 眞珠瑠璃 와 : 진주 유리
·가패벽옥 珂貝璧玉 과 : 가패 이것도 전부 보물에 해당된다. 벽옥 이것도 전부 보물이고
·산호등물 珊瑚等物 과 : 산호 그러한 등등의 사물과
·진보영락엄신지구 珍寶瓔珞嚴身之具 와 : 진보와 영락과 엄신지구와
·상마거승 象馬車乘 과 : 코끼리 말 수레 타는 것
·노비인민 奴婢人民 과 : 노비 인민
·성읍취락 城邑聚落 과 : 성읍 취락 이것이 왜 보시에 해당되는가 하면 옛날에는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몇 가호 몇 개 마을 몇 개 고을 이런 것을 떼어줬다.
· 국가에 공이 있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공이 있거나 공이 있는 사람은 면 소재지 같은 것 하나를 다 떼서
그 사람이 세금 받아서 중앙에 올릴 것을 적당히 올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다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성읍취락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하 고 있는 도시 읍 그리고 마을 고을 면소재지 군소재지 심지어 시까지도 보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읍지락과 같은 것을 보시한다고 해 놓았다.
·원림대관 園林臺觀 과 : 원림과 대관과 대관은 전망대 같은 것이다.
·처첩남녀 妻妾男女 와 : 처 첩 남 녀
·내외권속 內外眷屬 과 : 내외 권속
·급여소유진완지구 及餘所有珍玩之具 와 : 그리고 나머지 소유 진완지구와
·두목수족 頭目手足 과 : 머리 목 수족
·혈육골수 血肉骨髓 와 : 혈육 골수
·일체신분 一切身分 을 : 일체 신분을
·개무소석 皆無所惜 하야 : 다 아끼는 바가 없어서
·위구제불광대지혜 爲求諸佛廣大智慧 하나니 :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니라. ·
이런 보시를 왜 하느냐?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뜻이다.
· 십지품 전에 십회향품에서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지루할 정도로 많이 들었다.
시명보살 是名菩薩 이 : 이것의 이름이 보살이
·주어초지 住於初地 하야 : 초지에 머물러서
·대사성취 大捨成就 니라 : 크게 버리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니라.
·불자 佛子 야 : 불자야 ·보살 菩薩 이 : 보살이
·이차자비대시심 以此慈悲大施心 으로 : 이 자비로써 크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위욕구호일체중생 爲欲救護一切衆生 하야 :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서
·전갱추구세출세간제이익사 轉更推求世出世間諸利益事 호대 : 더욱더 다시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이 익사를 추구하되 이것을 잘 들어야 된다.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서 세간에서나 출세간에 서의 이익되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익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 는 뜻도 아니다.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무피염고 無疲厭故 로 : 피곤해 하지 않을 만큼도 그렇게 열심히 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득성취무피염심 卽得成就無疲厭心 하며 : 곧 무피염심,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을 내며
·득무피염심이 得無疲厭心已 에 : 피염이 없는 마음을 얻고 나서
·어일체경론 於一切經論 에 : 모든 경과 논에 대해서
·심무겁약 心無怯弱 하고 : 마음에 겁약함이 없고
·무겁약고 無怯弱故 로 : 겁약이 없는 까닭에
·즉득성취일체경론지 卽得成就一切經論智 하며 : 곧 일체 경론의 지혜를 성취한다. 여기 경론이라고 할 때 왜 논 論 자가 자꾸 붙는가 하면
이것이 부처님 열반 후 한 600년경에 결집된 경전이기 때 문이다. 그때는 이미 논이 많이 생겼다.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해서 자기 소견을 붙이고 자기 깨달음을 부연해서 좀 더 자세히 하는 논들이 수없이 생겼다. 티벳 불교는 전부 논을 추종하는 불교다. 경전을 별로 안 본다.
여기 부산에 아주 똑똑한 티벳스님이 산다. 그래서 내가 ‘왜 경을 놔두고 논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냐?’하고 물어보았다. 알고보니 티벳불교도 일본처럼 종파 불교다.
티벳에서는 어떤 스님이 어떤 경전에 대해서 논을 써놓으면 그 스님을 위하고 그 스님의 주장만을 따르는 것이다. 부처님의 주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 스님이 써놓은 논을 중심으로 계속 그것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달라이라마가 설법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줄 안다. 그런데 경을 설명하지 않는다.
경전 설명이 없고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입보리행론이다. 그런 논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티벳불교가 종파불교라서 그 렇다.
티벳불교가 신심으로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신심이 장한 불교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왜 경전 을 가지고 안하고 경전을 재차 해석한 조사들의 논을 가지고 하는가?
경을 바로 보지 않고 논을 본 다는 점이다.
뒤에 해석한 논에는 아무래도 사견이 들어 있을 것이 아닌가.
아무리 훌륭한 논사고 훌륭한 보살이고 훌륭한 깨달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자기 소견 이 들어있다. 자기 소견이 들어있는 것 보다는 바로 경을 보는게 옳지 않느냐.
탄허스님이 늘 말씀 하시기를 소 疏 와 초 鈔 논 論 이런 것을 보지 말고 경 經 을 봐서 이해가 안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소를 보고 논을 보라, 이해가 되면 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셨다.
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가 있고 논이 있고 초가 있는 것이지 경을 제쳐놓고 논이나 소를 먼저
보고 그런 것을 중요시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일이라고 하셨다. 참 맞는 말씀이다.
여기 보면 그래서 경론이라는 말이 잘 나온다.
심무겁약 무겁약고로 경론에서 가르치는 그런 지혜를 성취하며
·획시지이 獲是智已 에 : 이러한 지혜를 얻고 남에
·선능주량응작불응작 善能籌量應作不應作 하야 : 잘 능히 응작 꼭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불응 작을 헤아려야 된다. 선주량한다. 잘 살펴보고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
·어상중하일체중생 於上中下一切衆生 에 : 상중하 일체 중생에게 있어서
·수응수력 隨應隨力 하고 : 마땅한 바를 따르고 힘을 따르고
·수기소습 隨其所習 하야 : 그가 익힌 바를 잘 따라서
·여시이행 如是而行 일새 : 이와 같이 행할새
·시고 是故 로 : 시고로 ·보살 菩薩 이 : 보살이
·득성세지 得成世智 하며 : 세상지혜를 이루며
·성세지이 成世智已 에 : 세상지혜를 이루고 나서
·지시지량 知時知量 하야 : 시간도 안다. 시의적절한가 이 말을 할 땐가 아닌가 이것을 알고 또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마음의 양이 되어있는가, 그릇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아서
·이참괴장엄 以 慚 愧莊嚴 으로 : 참괴장엄으로,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장엄으로 ·근수자리이타지도
勤修自利利他之道 일새 : 부지런히 자리이타의 도를 닦을새
·시고 是故 로 : 이러한 까닭으로
·성취참괴장엄 成就 慚 愧莊嚴 하며 : 참괴장엄을 성취하며
·어차행중 於此行中 에 : 이러한 수행 가운데에
·근수출리 勤修出離 하야 : 생사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지런히 닦아서
·불퇴부전 不退不轉 하야 : 물러서지도 않고 굴리지도 아니해서, 퇴전하지 아니해서
·성견고력 成堅固力 하며 : 견고한 힘을 이루며
·득견고력이 得堅固力已 에 : 견고한 힘을 얻고 남에
·근공제불 勤供諸佛 하야 : 부지런히 모든 부처님께 공양해서
·어불교법 於佛敎法 에 : 불교법 가운데서, 불교법 중에서
·능여설행 能如說行 이니라 : 능히 설한 바 대로 행하나니라.
13, 十地淸淨 十種法
佛子야 菩薩이 如是成就十種淨諸地法하나니 所謂信慈悲喜捨와 無有疲厭과 知諸經論과 善解世法과 慚 愧堅固力과 供養諸佛하야 依敎修行이니라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이 모든 지위를 청정하게 하는 열 가지 법을 성취하느니라. 이른바 신 심과 자비와 기꺼이 버림과 고달픔 없음과
모든 경론 經論 을 아는 일과 세간법을 잘 아는 것과 부 끄러움과 견고한 힘과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과 가르친 대로 수행하는 것이니라.”
·십지청정 十地淸淨 십종법 十種法 : 모든 지위를 청정하게 하는 열 가지 법
지금 환희지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 환희지를 통해서 나머지 법운지까지 십지를 다 훌륭하게 하는 열 가지 법이라는 뜻이다.
·불자 佛子 야 : 불자야 ·보살 菩薩 이 : 보살이
·여시성취십종정제지법 如是成就十種淨諸地法 하나니 : 이와 같이 열 가지 청정한 모든 지위의 법을 성취하나니
·소위신자비희사 所謂信慈悲喜捨 와 : 소위 자비희사와
·무유피염 無有疲厭 과 : 무유피염과
·지제경론 知諸經論 과 : 모든 경론을 아는 것과
·선해세법 善解世法 과 : 세상법을 잘 선해 잘 이해하는 것과
·참괴견고력 慚 愧堅固力 과 : 참괴하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견고한 힘과
·공양제불 供養諸佛 하야 : 제불에게 공양해서
·의교수행 依敎修行 이니라 :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함을 믿느니라. 저 위에 소위 신 信 했는데 신을 여기에 새기면 좋다.
십지가 훌륭해지려면 열가지 법이 전부 필요한 것이다. 어디에서든지 다 필요하다.
십지까지 올라가면서 다 필요한 것을 여기에 소개를 했다. 그렇게 하고는 그다음에 환희지의 공 과라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초지공부를 했다면 그다음에는 어떤 공과가 있느냐?
어떤 결과, 어떤 공덕이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죽 또 소개한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