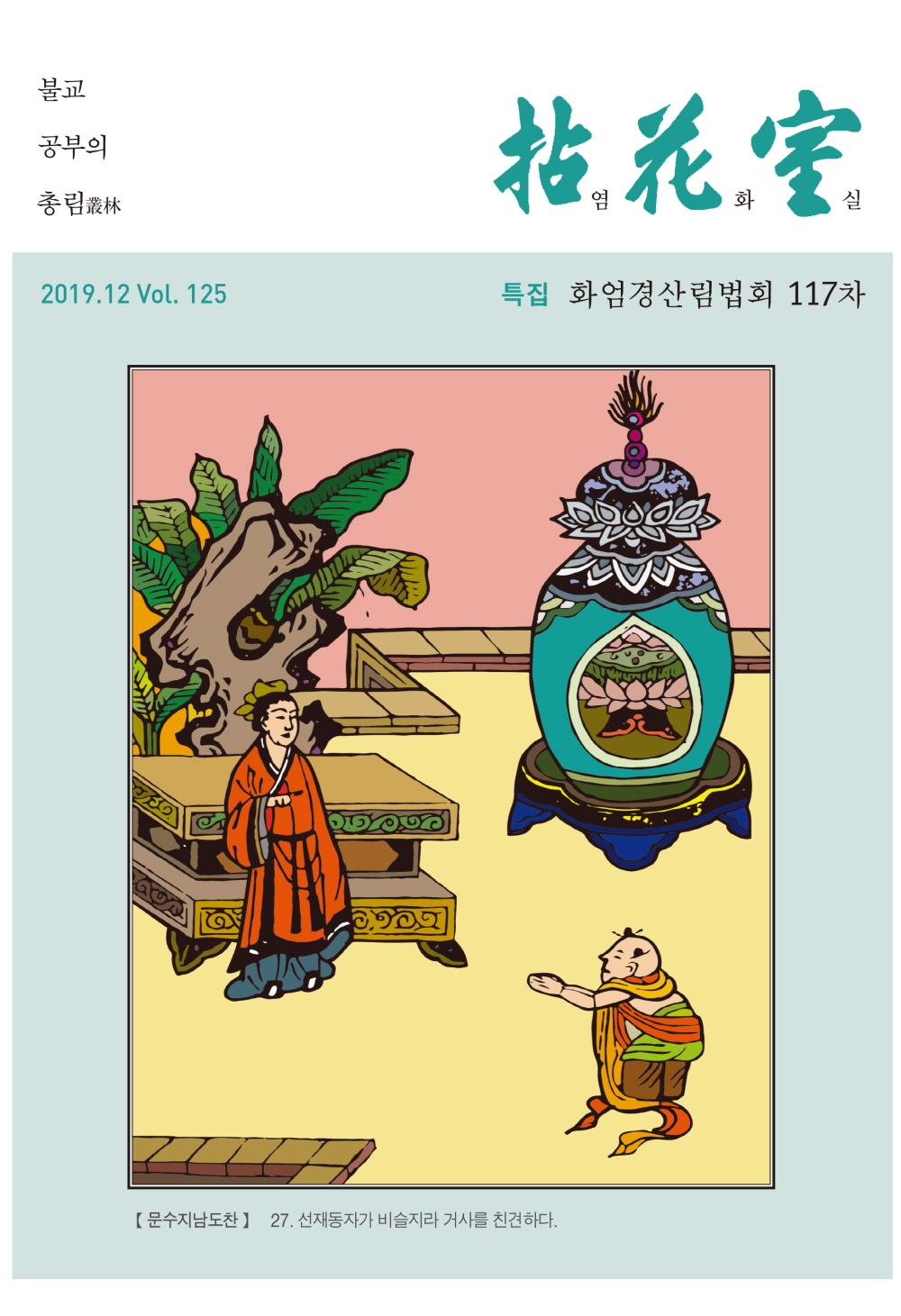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三十七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三十七 十二, 第六現前地 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맑은소리맑은나라 작성일20-01-22 09:48 조회1,609회 댓글0건본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선지식이다.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부모가 첫째 제일 선지식이고 유아
시절에는 유아를 잘 돌보는 사람이 선지식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선지식도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난 가장 뛰어난 선지식
은 바로 이 화엄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화엄경에 모든 열쇠가 다 있다. 화엄경은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는 만능열쇠다.
화엄경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가르침의 책들이 있지만
비교할 수 없이 첫째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책이다. 어
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가르침이 화엄경 안에
꽉꽉 차 있다.
나는 강의하면서 ‘책장 넘기기가 너무 아깝다’는 표현을
자주 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 하는 과제만 남아있을 뿐이다.
화엄경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엄경을 읽어보면 읽어
볼수록 이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은 없다는 것을 늘 느낀
다.
*
오늘 입승스님이 <관음예문>을 내가 번역했다고 소개했
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기도문의 지은이는 소소매라는
분이다. 소소매는 소동파의 여동생이고 옮긴이는 법인스
님이라는 분이다. 이 번역은 아주 관심깊게 마음에 담아
두고 번역한 글이다.
불교에 의식이 많지만 그 많고 많은 의식문 중에 그 글
이 아름답기로 치면 첫째가는 것이 관음예문이다.
우리 어릴 때는 정초에 일주일씩 또는 21일씩 관음예문
의식을 꼭 했다. 나와 있는 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연비(燃臂)도 다 하면서 관음예문을 읽으면 두 시간이 조
금 더 걸린다.
나는 학인 때부터 번역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더러 마음
에 드는 구절은 번역을 해보기도 하였다. 그 마음이 자라
서 나중에 역경연수원에 지원을 했다.
신문에 역경연수생을 뽑는다고 하기에 지원을 해서 시험
을 치고 합격을 해서 연수원 생활을 했다.
연수원에서는 당시까지 번역된 한글로 된 모든 책들을
다 모아 놓고 원문과 대조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말
로 바꾸었다’ 등등 연수생들이 앉아서 같이 토론하는 세
월을 보냈다.
그래서 나는 늘 번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
내가 보기에 보현행원품은 우리나라의 천하 문장가 조지
훈씨 가 번역한 것이 정말 잘 되었다.
조지훈씨는 본래 고향이 영양 사람이다. 영양에 선비가
많이 났다. 소위 고려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또 우리나
라 시인 세 사람을 묶어서 청록파 시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도 들어가고 또 그분은 불교를 좋아해서 월정사 강
원에서 일반 교수로서 월정사 강원에서 초빙을 받아서
국어강사를 하기도 했다.
우리가 역경원에 있을 때 당시 번역을 제일 빼어나게 할
사람을 세 사람 뽑아서 당시로서는 모두 젊고 빼어난 문
장가인 세 분이 번역한 책을 묶어서 역경원 개원 1주년
기념으로 만든 적이 있다.
그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대로 보현행원품은 조지훈씨 한
테 맡기고 법화경 보문품은 이기영씨에게 맡기고 원각경
보안장은 법정스님한테 맡겼다.
우리는 그렇게 번역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이 관세음 이 번역을 내가 읽어보니까 불교 경전
이나 염불문 의식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제일 번역이 아
름답게 잘 되어 있지 않았나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한
다.
이 책을 그전에도 여러 만권을 찍어서 보급을 했는데 이
번에 지상스님 절에서 관세음보살을 모시게 되어서 그
인연으로 이 책을 다시 활자도 키워서 책으로 냈다.
내용 하나하나가 다 좋은 구절인데 잠깐 31쪽을 보겠다.
가슴에 와 닿는 이 단락을 점안식도 할 겸 천천히 마음
을 담아서 다 같이 읽겠다.
관음예문 p31
지심정례공양
재앙의 세월이 온다 하여도
내게는 두려움 이미 없도다
님의 눈 어느 때고 나를 보시니
내게는 두려움 이미 없도다
멸망의 세상이 된다 하여도
내게는 근심 걱정 이미 없도다
님의 귀 어딜 가나 나를 들으시니
내게는 근심 걱정 이미 없도다
내 음성 다 들어 주시고
내 모습 낱낱이 살펴 주시는
관세음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 주소서
하 맑아라 저 눈빛이여
연꽃 같은 저 눈망울이여
초승달로 떠 있는가
감청색 빛나는 눈썹이시여
머리 뒤 둥근 광명은
금빛으로 눈부시고
그 빛 속 수놓은 듯
찬란한 구슬 광명이여
몸으로 지은 업장 참회하오며
나 이제 당신께 귀의하오니
원합니다 걸림 없는 하늘 눈으로
저희의 모습을 맑게 살피사
바른 귀의 바른 참회 되게 하소서
관세음보살 멸 업장 진언
옴 아로늑계 사바하
옴 아로늑계 사바하
옴 아로늑계 사바하
기나긴 겁 동안에 쌓고 지은 죄
홀연히 한 생각에 없어지이다
불꽃이 마른 풀을 태워 버리듯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지이다
참회 진언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갖가지 모습과 방법으로써
법계를 떠돌던 지나간 생들
청정함 여의고 음행했으니
산같이 쌓인 업장 멸해 주소서
나 이제 엎드려서 참회하옵고
금강의 마음으로 원하옵나니
갖가지 지은 죄장 청정해져서
생생토록 보살의 길 걷게 하소서
여시회해 제불제보살
*
참 좋지 않은가. 가슴에 팍팍 스며들게 이렇게 아름답게
도 번역이 된다.
염불, 경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소화를
시키고 또 어느 정도 시적소양이나 문학적 소양이 있다
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 스님들은 모두 포교의 일선에 계시니까 한 번씩 번
역을 해보는 훈련도 필요하다.
또 이것을 가지고 의식문으로 그대로 써도 좋다.
이 책을 천천히 읽어도 40분쯤 걸린다. 지금은 염불도
자꾸 번역을 해서 하는 시대인데 이것을 가지고 관음예
문 의식을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서 권하고 싶다.
*
순전히 나의 개인 주관적인 입장에서 불교번역 유교번역
불교 경전번역을 통틀어서 제일 빛나는 번역 한가지를
선택하라면 동심초를 꼽는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이것은 우리나라 글이 아니라 당나라 때 설도(薛濤)라고
하는 시인의 한시를 번역한 글이다.
우리나라 김억이라는 일제시대 유명한 시인이 번역을 했
다.
하도 번역이 잘 되어서 그 글이 나오자마자 곡이 붙여지
고 유행을 했다. 당나라 시인데 번역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놓으니까 다들 우리나라 시인줄 알고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번역이 된다. 번역도 제대로만 하면 원문 이
상의 감동을 주는 것이다.
내가 동심초의 원문과 번역을 갖다놓고 아무리 맞춰봐도
번역문 같이 한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런데 번역
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었다. 여러분도 한 번 찾아보기 바
란다.
사연들이 다 그 속에 담겨 있다.
관음예문도 여성이 썼고 동심초를 쓴 설도도 당나라 여
시인이어서 감성이 아무래도 남자와 다른 것 같다.
*
그것 저것 다 덮어놓고 모든 번역을 통틀어서 제일 잘
된 번역이 있다. 여러분도 혹시 평소에 ‘이 번역이 기가
막히게 잘 됐다’ 싶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번역 한마디로 크게 성공한 종교가 기독교다.
하느님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 그 여호와라는 히브리
어를 다른 데서는 갓(God)이라고 번역을 하고 다른 데서
는 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성공을 못했다.
단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서 대히트를
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가 엄청난 포교를 하게 됐고
기독교 포교에 아주 큰 플라스가 되었다.
하느님, 딱 한마디, 그 번역이 대단하다.
번역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 사람들이 일찍이 여호와를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게 자기가 쓰니까 자기들 것이 된 것이다.
또 신기하게도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 비슷해서 그만 우
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과 같이 겹쳐서 이해하게
되어 버렸다. 그런 번역의 유명한 사건도 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번역 동심초라고 하는 번역 그다음에
특히 관음예문 이 번역도 나는 불경 번역으로써 최고의
번역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말씀드렸듯이 역경원에서 번역을 시도했던 보문품 원
각경 보안장 보현행원품 그렇게 세 가지를 묶은 번역도
아주 뛰어난 번역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번역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 인연으
로 역경연수원에 가서 공부를 했고 그 후에도 번역에 대
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다.
관음예문 이 책은 내가 얼마든지 찍을테니까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인연하는 사찰의 신도님들이 다 하나씩 지참
하고 다니도록 하시기 바란다.
*
요즘 몸에 고장이 많이 나니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
어서 내가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까페 염화실 안에 보면
건강란이 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건강에 대한 글을 올렸다.
각 나라의 건강에 대한 한마디인데 우리가 기억하고 실
천해야 할 일이 많아서 프린트로 뽑아 왔다.
여러분들도 방에 붙여놓고 실천하셔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란다. 오늘은 450쪽(화엄경 제2권 민족사刊) 본문을
할 차례다.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三十七
十地品 第二十六之四
十二, 第六現前地
3. 緣起의 相을 總觀
(4) 十二有支의 自業助成門
佛子야 此中無明이 有二種業하니 一은 令衆生으로 迷相
所緣이요 二는 與行作生起因이며 行亦有二種業하니 一은
能生未來報요 二는 與識作生起因이며 識亦有二種業하니
一은 令諸有相續이요 二는 與名色作生起因이며 名色도
亦有二種業하니 一은 互相助成이요 二는 與六處作生起因
이며 六處도 亦有二種業하니 一은 各取自境界요 二는 與
觸作生起因이며 觸亦有二種業하니 一은 能觸所緣이요 二
는 與受作生起因이며 受亦有二種業하니 一은 能領受愛憎
等事요 二는 與愛作生起因이며 愛亦有二種業하니 一은
染着可愛事요 二는 與取作生起因이며 取亦有二種業하니
一은 令諸煩惱相續이요 二는 與有作生起因이며 有亦有二
種業하니 一은 能令於餘趣中生이요 二는 與生作生起因이
며 生亦有二種業하니 一은 能起諸蘊이요 二는 與老作生
起因이며 老亦有二種業하니 一은 令諸根變異요 二는 與
死作生起因이며 死亦有二種業하니 一은 能壞諸行이요 二
는 不覺知故로 相續不絶이니라
“불자여, 이 가운데 무명에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
는 중생으로 하여금 반연할 바를 미혹하게 함이요, 둘은
행을 생겨나게 하는 인[生起因]을 짓느니라.
행에도 또한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능히 미래의
과보를 내는 것이요, 둘은 식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짓
느니라.
식에도 또한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모든 존재[諸
有]를 서로 계속하게 함이요, 둘은 이름과 물질[名色]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짓느니라.
이름과 물질에도 또한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서로
도와서 성립케 함이요, 둘은 6처를 생겨나게 하는 원인
을 짓느니라.
6처에도 또한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각각 제 경
계를 취함이요, 둘은 촉(觸)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짓
느니라.
촉에도 또한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반연할 것을
능히 부딪침이요, 둘은 받아들임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짓느니라.
받아들임에도 또한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사랑스
러운 일과 미운 일을 받아들임이요, 둘은 사랑을 생겨나
게 하는 원인을 짓느니라.
사랑에도 또한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사랑할만한
일에 물듦이요, 둘은 취함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짓느
니라.
취함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여러 가지 번뇌를
서로 계속케 함이요, 둘은 유(有)를 생겨나게 하는 원인
을 짓느니라.
소유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능히 다른 갈래에
태어나게 함이요, 둘은 태어남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짓느니라.
태어남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여러 온(蘊)을
일으킴이요, 둘은 늙음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짓느니
라.
늙음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여러 근(根)이 변
하여 달라지게 함이요, 둘은 죽음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을 짓느니라.
죽음에도 두 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모든 행을 파괴함
이요, 둘은 깨달아 알지 못하므로 서로 계속되어 끊어지
지 않느니라.”
*
십이유지(十二有支)의 자업조성문(自業助成門) : 자체의
업이 다른 업을 도와 성립하다
*
자업조성문(自業助成門) 자기의 업을 이루어 가는 문은
사람의 일생이다. 십이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
나기 이전부터 태어나게 된 원인에서부터 태어나고 성장
하고 사물을 관찰하고 내가 욕심을 내어 내 것으로 만들
고 그러다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들을 죽 앞에서
도 공부해 왔는데 여기에서 최종 정리하는 형식을 취하
고 있다.
유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항목
이렇게 알면 된다. 일생을 열 두 개의 항목으로 나눴다고
보면 된다.
*
불자(佛子)야 : 불자야
차중무명(此中無明)이 : 이 가운데 무명이
유이종업(有二種業)하니 : 유이종업하니, 무명행식 명색
육입 해서 무명이 첫째 항목이다. 거기에 두 가지 업이
있다.
일(一)은 : 첫째는
영중생(令衆生)으로 : 중생으로 하여금
미상소연(迷相所緣)이요 : 반연할 바를 미혹하게 한다.
이것은 뭔가 모른다는 것이다. 무명이란 것이 무엇인가.
어둠뿐이다. 밝음이 없다. 캄캄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분
석하고 알려고 해도 분석할 수도 없고 알아지지 않는 것
이 무명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무명이다. 어둡다는 말이
다. 어두운 데서는 아무리 동서남북을 찾아봐야 찾아지지
않는다.
이(二)는 : 이는
여행작생기인(與行作生起因)이며 : 행으로 무명행이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무엇이 하나 있다. 그
것이 가만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인다. 행(行)이다.
그 행으로 더불어 생기인을 짓는다.
뭔가를 작동해서 꿈틀대서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무명이 그렇다. 가만 있으면 괜찮은데 가만 있어지
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태어나기 이전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잠에서 깨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된다. 잠에서 깨기 전에
이미 무명이 움직인다. 무명은 있었고 그것이 움직여서
잠이 깬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행(行)자는 그렇
게 알면 된다.
행역유이종업(行亦有二種業)하니 : 행에도 또한 두 가지
업이 있다.
일(一)은 : 일은
능생미래보(能生未來報)요 : 미래에 대한 과보를 능히 낸
다.
움직였으니까 움직이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기 마련이
다.
예를 들어서 일어났으니까 세수를 해야 되고 예불할 때
가 되었으니까 세수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이 과보가 된
다.
이(二)는 : 둘은 무명행식이니까 행 다음으로 식이 나왔
다.
여식작생기인(與識作生起因)이며 : 식 인식하는 것이 말
하자면 인식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조건이 된다.
식으로 더불어 생기인을 짓는다. 식으로 더불어 일어나
는, 생기 하는 원인을 짓는다. 행이 식을 생기한다. 앞으
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온다.
식역유이종업(識亦有二種業)하니 : 식에도 또한 두 가지
업이 있다.
일(一)은 : 일은
영제유상속(令諸有相續)이요 : 모든 존재 있음으로 하여
금 상속하게 하는 업이 있고
이(二)는 : 두 번째 업은
여명색작생기인(與名色作生起因)이며 : 명색으로 더불어
생기인을 짓는다. 명과 색이 정신적인 입장과 육체적인
입장이다. 우리가 인식 작용이 있으면 그 인식 작용에는
인식하는 정신적인 작용이 있고 몸뚱이가 또 있다.
깨어보니까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
누워서 잠은 막 깨었는데 몸이 딸려 있다. 몸이 가뿐하다
하면 가뿐한 대로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어디 병이 있으
면 병이 있는 대로 그런 것을 동시에 인식하게 되는 것
이다.
명색(名色)도 : 명색도
역유이종업(亦有二種業)하니 : 또 이종업이 있다.
일(一)은 : 하나는
호상조성(互相助成)이요 : 서로서로 조성한다. 도와서 이
룬다. 명은 정신적인 것이라면 색은 육체적인 것이다.
육체적인 것은 육처로써 거기에 안이비설신의 이런 것이
거기에 또 생기기 시작한다.
이(二)는 : 이는
여육처작생기인(與六處作生起因)이며 : 육처로 더불어 생
기하는 인을 짓는다. 육처가 일어나게 한다. 육처라고 했
지만 여기서는 육입이라는 뜻이다. 육입은 안이비설신의
아니면 육근이라고 해도 좋다.
육처 육경도 사실은 동시에 있다. 눈하고 눈에 들어오는
대상 사물 경계가 사실은 동시다.
그래서 처(處)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육입이나 육근을 가지고 그것을 생기하는 원인이 된다.
육처(六處)도 : 육처에도
역유이종업(亦有二種業)하니 : 역유이종업이라.
일(一)은 : 하나는
각취자경계(各取自境界)요 : 각각 자신의 경계를 취한다.
눈[眼]하면 눈의 경계는 색(色)이다. 사물이다.
귀[耳]는 소리다. 소리가 자경계(自境界) 자신의 경계다.
그런 식으로 각자의 경계가 되는 것이다.
이(二)는 : 이는
여촉작생기인(與觸作生起因)이며 : 촉으로 더불어 생기하
는 원인을 만든다. 그러니까 육입하면 그 다음에는 촉이
다. 감촉한다. 육근이 전부 같이 감촉하는 것이다.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혀는 혀대로 몸은
몸대로 전부 각자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만나서 어떤 느
낌을 만들어 낸다.
촉역유이종업(觸亦有二種業)하니 : 촉에도 이종업이 있
다.
일(一)은 : 하나는
능촉소연(能觸所緣)이요 : 반연할 바를 능히 감촉한다.
대상을 만난다는 말이다. 부딪친다. 촉은 부딪친다. 감촉
한다. 그런 뜻이다.
이(二)는 : 이는
여수작생기인(與受作生起因)이며 : 받아들이는 것으로써
생기인을 짓는다. 수 감촉해 보니까 ‘아 이거 추우니까
이불을 당겨서 덮는다’ 그런 것이 수다.
공기가 차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또 시원하면 시원
하다고 받아들이고 더우면 덥다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
몸뚱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의 생
기인을 짓는다.
수역유이종업(受亦有二種業)하니: 수에도 받아들이는 데
도 또한 이종업이 있다.
일(一)은 : 일은
능령수애증등사(能領受愛憎等事)요 : 좋다 싫다 하는 것
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있다. 애증 등의 일을 받아
들인다. 좋다 싫다 하는 등의 일을 받아들인다.
이(二)는 : 이는
여애작생기인(與愛作生起因)이며 : 마음에 드는 것은 애
착하니까 받아들여 보고 ‘아 이것은 괜찮은 것이다’ 해서
따뜻하면 따뜻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 그것을 또 애착
하는 것이다. 애로 더불어 생기인을 짓는다.
애역유이종업(愛亦有二種業)하니 : 애착하는 데도 이종업
이 있다.
일(一)은 : 일은
염착가애사(染着可愛事)요 : 가히 애착할만한 일에 대해
서 물든다. 받아들이고 ‘아 이거 좋다’하는 시간이 경과
하면 거기에 그만 염착해버려서 같이 물들어 버린다. 가
히 애착할 만한 것에 물들고
이(二)는 : 이는
여취작생기인(與取作生起因)이며: 취로 더불어 생기인을
짓는다. ‘좋으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취할 취(取)자
다. 이 십이인연이 관계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다.
취역유이종업(取亦有二種業)하니 : 취에도 또한 이종업이
있으니
일(一)은 : 일은
영제번뇌상속(令諸煩惱相續)이요 : 모든 번뇌로 하여금
취하다 보면 거기에 번뇌가 일어난다. 모든 번뇌가 상속
한다.
이(二)는 : 이는
여유작생기인(與有作生起因)이며 : 소유한다. 유(有)자는
소유한다는 말이다. 취해서 ‘요거는 내거로 만들어야지.
이건 남 안줘야지’ 그것이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명예
가 됐든 돈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전부 그런 과정
을 거친다. 취하고 소유하고 애착하고 취하고 소유하고
소유한 데 대한 생기인을 짓는다.
유역유이종업(有亦有二種業)하니 : 소유하는 데도 또 이
종업이 있으니
일(一)은 : 일은
능령어여취중생(能令於餘趣中生)이요 : 능히 다른 갈래들
다른 어떤 삶의 길로 하여금 생하게 한다.
소유하니까 소유하는 것에서부터 온갖 그런 일들이 벌어
지는 것이다. 여취가 그것이다.
이(二)는 : 이는
여생작생기인(與生作生起因)이며 : 여생으로 작생기인 하
며 생, 삶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또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
이다.
생기인을 짓는다. 생으로 더불어 생기인을 짓는다.
생역유이종업(生亦有二種業)하니 : 생에도 또한 이종업이
있어서
일(一)은 : 일은
능기제온(能起諸蘊)이요 : 능히 오온을 내고 그것을 일으
킨다. 살아가는 것은 결국 오온이 작동하는 것이다. 오온
이 작동하는 것을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는 일은
딴 것이 아니라 오온이 작동하는 것이다. 오온 없이 사는
일은 없다. 능기제온이요.
이(二)는 : 이는
여노작생기인(與老作生起因)이며 : 늙음으로 더불어 살다
보면 결국은 고물이 되어간다.
고물로 되어가는 것, 늙는 것으로 하여금 생기인을 짓는
다. 세월가는데 안 늙는 장사가 없다.
노역유이종업(老亦有二種業)하니 : 늙는 데도 이종업이
있다.
일(一)은 :일은
영제근변이(令諸根變異)요 : 제근이 변이한다.
얼굴이 쭈글쭈글 해지고 머리도 희끗희끗 해지고 이도
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다리도 어둔해지고 온갖 것이
변하고 달라진다. 제근으로 하여금 변이되어 간다.
우리들 가운데도 거의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이 꽤 있다.
이(二)는 : 두 번째가 문제다.
여사작생기인(與死作生起因)이며 : 그렇게 변이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겠는가? 죽음으로 향한다. 여사(與
死) 죽음으로 더불어 생기인을 짓는다. 생기인은 죽음을
만들어 낸다. 죽음을 만들어 낸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어
폐가 있지만 그럴 수 밖에 없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객관시해 놓고 보면 죽음을 만들
어 내는 것이다.
사역유이종업(死亦有二種業)하니 : 죽음에도 두 가지 업
이 있다.
일(一)은 : 일은
능괴제행(能壞諸行)이요 : 모든 행이 작용이 무너져 버린
다. 죽으면 모든 행이 다 무너져 버린다. 행이 안 무너지
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다. 숨을 쉬거나 팔다리가 움직
이거나 하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지 아직 괴(壞)가 아니
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서 꼼짝 안 하면 의사가 와서 딱
이렇게 진찰해 보고 숨도 안 쉰다. 심장도 안 뛴다. 그게
다 괴다. 제행이 괴해 버리고 모든 행위가 무너져 버린
다.
이(二)는 : 이는
불각지고(不覺知故)로 : 각지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상속부절(相續不絶)이니라 : 계속해서 불각지고로, 육입
이 육처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속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것을 가지
고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면 한 시간 법문 거리는 충분하
다.
그리고 제일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삶의 과정이다.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5) 十二有支의 不相捨離門
佛子야 此中無明緣行으로 乃至生緣老死者는 由無明乃至
生爲緣하야 令行乃至老死로 不斷助成故요 無明滅則行滅
로 乃至生滅則老死滅者는 由無明乃至生不爲緣하야 令諸
行乃至老死로 斷滅不助成故니라
“불자여, 이 가운데서 무명은 행을 반연하고 내지 태어
나는 것은 늙어 죽음을 반연하여 무명이나 내지 태어남
이 연(緣)이 되어서 행이나 내지 늙어 죽음으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고 도와서 이루게 하는 연고이니라.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滅)하므로 내지 생이 멸하면 늙고
죽음이 멸한다는 것은 무명과 내지 생이 인연이 되지 아
니함을 말미암아서 모든 행과 내지 늙고 죽음으로 하여
금 소멸하여 도와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연고이니라.”
*
십이유지(十二有支)의 불상사리문(不相捨離門)
*
십이유지, 열 두 개의 항목이 서로 떠나있지 않는 문(門)
이다.
*
불자(佛子)야 : 불자야
차중무명연행(此中無明緣行)으로 : 이 가운데 무명연행으
로.
우리가 무상게를 외우는데 ‘무명연행(無明緣行)하고 행연
식(行緣識)하며 식연명색(識緣名色)하고 명생연육입(名色
緣六入)하고 육입연촉(六入緣觸)하고 촉연수(觸緣受)하고
수연애(受緣愛)하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도 그
과정이다.
무명이 행을 연하므로 또 행이 식을 연하고 식이 명색을
연하고
내지생연노사자(乃至生緣老死者)는 : 내지 생이 노사를
연한다고 하는 것은
유무명내지생위연(由無明乃至生爲緣)하야 : 무명을 말미
암아서 생이 연이 되어서
영행내지노사(令行乃至老死)로 : 행으로 하여금 내지 노
사에 이르기까지
부단조성고(不斷助成故)요 :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
가는 까닭에
무명멸즉행멸(無明滅則行滅)로 :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
한다.
무상게에 ‘무명멸즉행멸(無明滅則行滅)하고 행멸즉식멸
(行滅則識滅)하고 식멸즉(識滅則) 명색멸(名色滅)하고’ 하
는 것을 환멸문(還滅門)이라고 한다.
내지생멸즉노사멸자(乃至生滅則老死滅者)는 : 내지 생이
멸한즉 노사가 멸한다. 결국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중간 과정이 전부 생략되어서 ‘내지(乃至)’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다.
유무명내지생불위연(由無明乃至生不爲緣)하야 : 무명을
말미암아서 내지 생이 연이 되지 아니해서
영제행내지노사(令諸行乃至老死)로 : 제행으로 하여금 내
지 노사에 이르기까지
단멸불조성고(斷滅不助成故)니라 : 단멸해서 도와서 이루
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끝난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아니지만 순환문과 환멸문 이렇게 두 가
지 방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기본불교 초기불교의 아
주 기본적인 교리다. 아주 철저히 소승교리인데 화엄경에
서는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 소승교리를 이렇게 한번 슬쩍 짚고 넘어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쯤 슬쩍 생략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다 소
화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도 명색이 화엄경인데 아예 짚지 않고 넘어갈 수 없
어서 이렇게 한 번 거치는 것이다.
(6) 三道不斷門
佛子야 此中에 無明愛取不斷은 是煩惱道요 行有不斷은
是業道요 餘分不斷은 是苦道라 前後際分別이 滅하면 三
道斷이니 如是三道가 離我我所하야 但有生滅이 猶如束蘆
니라
“불자여, 이 가운데서 무명과 사랑과 취함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번뇌의 길이요, 행(行)과 유(有)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업의 길이요, 다른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고통의 길이니라. 앞의 것[前際]이라 뒤의 것[後際]이라
하는 분별이 소멸하면 세 길이 끊어지나니, 이러한 세 길
은 ‘나’와 ‘내 것’을 여의고 다만 나고 소멸하는 것
만이 있는 것이 마치 묶어서 세워 둔 갈대[束蘆]와 같으
니라.”
*
삼도부단문(三道不斷門) : 갈대의 묶음과 같음을 관하다
*
삼도가 끊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삼도는 혹(惑) 업(業) 고
(苦)다. 여기서는 번뇌, 업, 고로 나와있다. 번뇌 때문에
업이 생기고 업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삼도
다.
불자(佛子)야 : 불자야
차중(此中)에 : 이 가운데
무명애취부단(無明愛取不斷)은 : 무명 애취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시번뇌도(是煩惱道)요 : 이것은 번뇌도이고
행유부단(行有不斷)은 : 또 행이 또 끊어지지 않음이 있
는 것은
시업도(是業道)요 : 업도라.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계
속 그것이 움직여서 업을 짓는다.
여분부단(餘分不斷)은 : 그 나머지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시고도(是苦道)라 : 고도라. 곧 고통이 온다.
간단히 하면 번뇌, 업, 고. 번뇌, 업, 고 이것이 끊임없이
돈다. 고통을 받으니까 또 번뇌가 생기고 번뇌가 생기면
또 업을 짓게 되고 업을 지으면 고통이 오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돌아간다.
전후제분별(前後際分別)이 : 전후제의 분별이
멸(滅)하면 : 멸할 것 같으면
삼도단(三道斷)이니 : 삼도가 끊어진다. 번뇌가 끊어지든
지 업이 끊어지든지 고가 끊어지든지 어디서든 하나만
딱 끊어질 것 같으면
여시삼도(如是三道)가 : 삼도가 다 끊어진다. 하나만 끊
어지면 그 세 개가 다 끊어져서 올스톱 되어버린다. 여시
삼도가
이아아소(離我我所)하야 : 아와 아소를 나의 것을 떠나서
단유생멸(但有生滅)이 : 다만 생멸만 있는 것이
유여속로(猶如束蘆)니라 : 유여속로니라. 갈대 단을 묶어
서 서로 의지해서 겨우 서 있게 하는 것과 같다.
하나가 넘어져 버리면 세 개의 단이 다 무너진다.
그것이 업과 번뇌와 고가 갈대 세 개의 묶음을 서로 버
티고 서있게 하는 형식과 같다. 유여속로다.
초기경전에 이런 말이 여러 수십 번 나온다.
대승불교에 아주 주옥같은 가르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자세히 알 것은 없다.
이쯤 알고 넘어가도 된다.
근래에 초기불교 근본불교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
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자세한 교리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
(7) 三際輪廻門
復次無明緣行者는 是觀過去요 識乃至受는 是觀現在요 愛
乃至有는 是觀未來라 於是以後에 展轉相續하나니 無明滅
行滅者는 是觀待斷어니라
“다시 또 무명이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은 과거를 관(觀)
함이요, 식과 내지 받아들임은 현재를 관함이요, 사랑과
내지 소유는 미래를 관함이니 이 뒤부터 차츰차츰 서로
계속하느니라.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는 것은 관찰하
고 상대하여 끊는 [觀待斷] 것이니라.”
*
삼제윤회문(三際輪廻門) : 과거, 현재, 미래의 상속과 끊
는 길
*
삼제는 과거 현재 미래다. 과거 현재 미래가 윤회하는 문
이라.
*
부차무명연행자(復次無明緣行者)는 : 부차 무명이 행을
연한다고 하는 것은
시관과거(是觀過去)요 : 이것은 과거를 관하는 것이고 과
거를 보는 것이고 과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식내지수(識乃至受)는 : 식 내지 수는
시관현재(是觀現在)요: 현재를 관함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도표를 그려서 설명하는 것이 사전 같
은 데 보면 많이 나와 있다.
여기까지는 과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현재, 현재이면서도
과거에 연결되어 있고, 현재이면서도 미래에 연결되어 있
고, 미래이면서도 과거에 연결되어 있고 하는 등 이런 것
들이 자세히 나와있는 도표다.
애내지유(愛乃至有)는 : 애 내지 유는
시관미래(是觀未來)라 : 미래를 관함이라. 그것이 서로
관계가 되어 있다. 도표를 딱 그려놓고 보면 그런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어시이후(於是以後)에 : 그 후에
전전상속(展轉相續)하나니 : 전전히 상속하나니
무명멸행멸자(無明滅行滅者)는 : 무명이 멸함에 행이 멸
한다고 하는 것은
시관대단(是觀待斷)어니라 : 관찰하고 상대하여 끊는 것
이니라. 시관,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관하는데 그 관찰
하고 상대해서 끊는 것이다.
(8) 三苦集成門
復次十二有支가 名爲三苦니 此中無明行으로 乃至六處는
是行苦요 觸受는 是苦苦요 餘是壞苦니 無明滅行滅者는
是三苦斷이니라
“또 십이인연(十二因緣)을 세 가지 괴로움[三苦]이라 하
나니, 이 가운데 무명과 행과 내지 육처는 변천하는 괴로
움[行苦]이요, 촉과 받아들임은 괴로운 데서 생기는 괴로
움[苦苦]이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무너지는 괴로움[壞
苦]이니라.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는 것은 이 세 가
지 괴로움이 끊어지는 것이니라.”
*
삼고집성문(三苦集成門) :삼고와 그 끊는 길
*
삼고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문이다. 삼고가 앞에도 몇 번
나왔었다.
*
부차십이유지(復次十二有支)가 : 부차 십이 유지가
명위삼고(名爲三苦)니 : 삼고라고도 배대를 할 수 있는데
차중무명행(此中無明行)으로 : 차중에 무명행으로
내지육처(乃至六處)는 :내지 육처까지는
시행고(是行苦)요 :행고가 된다. 행할 행(行)자의 고(苦)
인데 유위법은 무상하기 때문에 행할 행자를 썼다고 생
각하면 된다.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여 윤회를 면치 못
하고 계속 굴러간다. 행할 행자의 고통, 가만히 있으면
편안할 텐데 가만있지 못할 테니까 행고다.
촉수(觸受)는 : 촉과 수는
시고고(是苦苦)요 : 시 고고다. 고고라고 하는 것은 추위
더위 질병 육체적인 고통이다.
여시괴고(餘是壞苦)니 :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괴고다.
행고 고고 괴고 이것이 세 가지 고통인데 괴고는 그대로
글자대로 파괴와 변화다. 정신적으로 뭔가 파괴되고 변화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있다.
무명멸행멸자(無明滅行滅者)는 : 무명이 멸함에 행이 멸
한다고 하는 것은
시삼고단(是三苦斷)이니라 : 이 삼고가 끊어지는 것이다.
멸하면은 끊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삼고단이라고 하였
다.
(9) 因緣生滅門
復次無明緣行者는 無明因緣이 能生諸行이요 無明滅行滅
者는 以無無明에 諸行亦無니 餘亦如是니라
“다시 또 무명이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은 무명이 인연이
되어 여러 행을 내는 것이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다
는 것은 무명이 없으므로 여러 행도 또한 없음이니, 다른
것들도 역시 그러하니라.”
*
인연생멸물(因緣生滅門) : 인연의 생멸
*
부차무명연행자(復次無明緣行者)는 : 부차 무명이 행을
연하고 한다는 것은
무명인연(無明因緣)이 : 무명인연이
능생제행(能生諸行)이요 : 능히 모든 행을 내게 된다.
무명행식 그렇게 나간다.
무명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캄캄한데 나부대기 때문
이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모르는 입장에서 캄캄한 밤에 일어나서 막
활동을 하면 여기가서 부딪치고 저기가서 부딪치고 밟아
서는 안될 것도 밟게 되고 부딪치치 않아야 할 곳에 가
서 부딪친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부 거기
에서 기인한다.
무명멸행멸자(無明滅行滅者)는 : 무명이 멸함에 행이 멸
한다고 하는 것은 무명멸즉 행멸 하고 행멸즉 식멸 하고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멸한다고 하는 것은
이무무명(以無無明)에 : 무명이 없음에
제행역무(諸行亦無)니 : 모든 행도 또한 없음이니
여역여시(餘亦如是)니라 : 나머지 것도 똑같다. 이와 같
다. 12인연을 낱낱이 번거롭게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니
까 이쯤으로 이해하라는 뜻이다.
(10) 生滅繫縛門
又無明緣行者는 是生繫縛이요 無明滅行滅者는 是滅繫縛
이니 餘亦如是니라
“무명이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은 얽매여 속박됨[繫縛]을
내는 것이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는 것은 얽매여
속박됨을 멸하는 것이니라. 다른 것들도 역시 그러하니
라.”
*
생멸계박문(生滅繫縛門) : 생멸의 속박과 속박의 소멸
*
생멸이 서로 속박되어 있다.
*
우무명연행자(又無明緣行者)는 : 무명이 행을 연한다고
하는 것은
시생계박(是生繫縛)이요 : 이것은 계박을 내는 것이고 속
박, 얽히고 속박됨을 내는 것이고
무명멸행멸자(無明滅行滅者)는 : 무명멸즉 행멸하고 행멸
즉 식멸하고 한다고 하는 이 과정은
시멸계박(是滅繫縛)이니 : 속박을 멸하는 것이니
여역여시(餘亦如是)니라 : 나머지도 또한 이와 같다. 앞
에 인연생멸문하고 생멸계박문하고 형식은 똑같다.
(11) 無所有盡門
又無明緣行者는 是隨順無所有觀이요 無明滅行滅者는 是
隨順盡滅觀이니餘亦如是니라
“또 무명이 행(行)의 연(緣)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
음을 수순하는 관찰이요, 무명이 멸(滅)하면 행이 멸한다
는 것은 다하여 소멸함을 수순하는 관찰이니, 다른 것도
역시 그러하느니라.”
*
무소유진문(無所有盡門) : 있는 것이 없어져서 다해 버림
*
다함이 있는 바가 없다.
*
우무명연행자(又無明緣行者)는 : 또 무명 연행자는 무명
이 행을 연한다고 하는 것은
시수순무소유관(是隨順無所有觀)이요 : 있는 바가 없음을
없는 관을 수순하는 것이다. 무소유 관을 수순하는 것이
고
무명멸행멸자(無明滅行滅者)는 : 무명 멸에 행멸자는
시수순진멸관(是隨順盡滅觀)이니 : 멸진관을 수순하는 것
이니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여역여시(餘亦如是)니라 : 전부 12인연을 낱낱이 들지 않
고
그렇게 앞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똑같은 과정이라는 뜻이
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